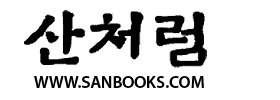원숭이 비하의 기원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관련링크
본문
*출처: 김종목의 정동늬우스 (http://jomosamo.khan.kr/search/인간의%20척도)
기성용 선수가 아시안컵 준결승 한일전에서 벌인 원숭이 세리모니를 두고 여러 말이 나왔다. 인종차별 응원을 일삼던 일부 스코틀랜드 팬들에 대한 기 선수의 복수라는 해명이 나오기도 했다. 복수는 스코틀랜드에서 할 것이지, 아시안컵 무대에서 할 건 아니었다. 기 선수의 인종 비하 코드 세리모니는 유감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서 비판할 일은 아니고. 마침 읽은 책 때문에 원숭이 비하의 기원과 쓰임이 생각나 몇자 정리.
축구 얘기를 좀 더 하면, 유럽 리그에서 일부 몰지각한 팬들이 ‘원숭이’ 비하 모욕을 많이 한다. 대상은 흑인 선수들이다. 원숭이 울음을 흉내내는 ‘우우’ 야유는 애교다. 땅콩이나 바나나를 선수에게 직접 던지기도 한다. 세네갈 출신의 엘 하지 디우프(블랙번 소속)는 2009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버튼 팬들이 나에게 원숭이 취급하며 바나나를 던지고 놀렸다”고 했다. 2008년에는 아틀레티코 팬들이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 소속 흑인 선수를 원숭이에 빗대는 야유를 해 논란이 인 적이 있다.
흑인 선수들만 당하는 건 아니다. 2009년 2월에는 뉴욕 포스트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을 침팬지에 비유해 사주인 루퍼트 머독이 사과하는 일도 있었다.
원숭이가 열등하고 저급한 종족을 비하하는 상징 동물이 된 것은 서구의 해외 팽창 시기다. 마침 읽고 서평을 쓴 책이 바로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서평보기).
책은 서양인의 우월 이데올로기가 모두 인종탓이라는, 인종 환원주의를 경계하는 책이지만 18세기 서구의 해외 팽창 시기 유럽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종주의에 관한 여러 사례들이 나온다.
“수백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서 - 기계 기술이나 제조 동을 이해한 부족은 한둘밖에 알려지지 않았다. 게다가 그들의 작업마저도 서투르고 형편없어서 오랑우탄이라도 어렵지 않게 할 정도였다”
18세기 말엽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롱은 ‘니그로들 Negroes’이 유럽의 기술을 채택하거나 스스로 발명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이다. 노예제도를 옹호했던 그는 천체 도구나 직조물을 만드는 아프리카인들의 능력을 얕잡아보면서 ‘니그로들’이 인간이하라는 주장을 폈다.
롱은 인간/아프리카인/원숭이라는 등급을 만들었는데, 체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을 끌어들이려 한 시도다. 그는 흑백 혼혈。흑인과 백인 사이에서 나온 아이는 자손을 낳을 수 없고, 아프리카인들은 원숭이와 성교를 한다고도 주장했다.
독일의사 S. T. 죔머링은 아프리카인인 ‘해부학적으로 원숭이에 가장 가깝다’고도 했다. 영국인 의사 찰스 화이트는 두개골의 형태에서 음경 크기에 이르기까지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보다는 원숭이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내렸다.
롱 같은 이들의 주장 이후 유럽 지식인과 정치인은 아프리카인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게 적절한지 논쟁을 벌였다. 논쟁중에 아프리카의 후진성은 천성적이거나 생물학적 차이와 결부시키는 사이비 과학은 계속됐다.
인종주의는 때로 유럽의 다른 민족에게도 적용됐다. A,H, 킨이란 사람은 앵글로색슨족을 최고의 인종인 코카서스 인종 중에서도 최고의 혈통으로 프랑스인을 열등한 인종 혈통이라고 간주했다. 그가 남긴 말은 “프랑스에 한사람의 발명가가 있다면, 영국과 미국에서는 10명이나 12명 정도는 쉽게 나올 수 있다.”이다.
한국의 인종주의의 기원? 2009년 출간된 <세계로 떠난 조선의 지식인들>이란 책을 보면 일단이 나와 있다. 싱가포르를 들른 민영환(1861~1905)은 첫 인상은 “토인은 모두 추하고 더럽고 빛이 검다”였다. 책의 지은이는 "서구 문명화의 담론인 위생과 패션이 내장되고, 타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은연 중 들어”간 것이다
다른 민족, 특히 백인을 제외한 유색 인종에 대해선 검고 더러운 종족이라는 민영화의 인식은 지금 이곳에 닿아 있다. 한국인들은 이주노동자 피부색과 함께 게으르고 멍청하다는 막연한 인상 욕설들을 날린다. 개그콘서트의 왕비호가 닉쿤에게 날린 “누가 봐도 태국 사람처럼 생겨야지”란 말도, 19세기 후반의 다른 민족과 인종에 대한 인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국인의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동양적 외모를 가졌다고 “프랑스처럼 생겨야지” “영국사람처럼 생겨야지”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다시 <기계, 인간의 척도가 되다> 책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책은 “서양인들의 문화의 물질적 우월성, 특히 과학적 사고와 기술 혁신에서 나타난 우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것이 해외에서 마주친 사람들에 대한 태도와 그들과의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검토”한 책이다. 처음 기독교라는 종교를 갖고 우월감을 갖고 있었는데, 18세기 증기기관, 수력 방적기 등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부터 ‘기계’들이 우월감의 척도가 되었다는 게 책의 핵심 주장이다.
서양의 기술적 ·과학적 성과가 비서양 문명이 달성한 발전의 전반적 수준을 가늠하는 주된 척도가 된 것이다. 이런 척도는 서구의 기계를 빨리 모방한 일본의 등장과 제1차 세계대전 그 잘난 유럽인들끼리의 대량 학살 이후 한풀이 꺾인 듯했지만, 기계와 과학에 근거한 우월 이데올로기는 전쟁 후 되살아났다는 게 지은이의 분석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